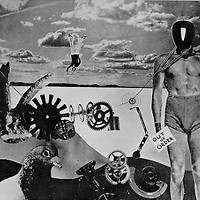또 길게 체류하는 손님을 좋아하게 된 경우, 그녀들은 손님의 밥상에 남은 것을 자신의 밥상에 옮겨서 식사를 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밥상인 경우다. 여자의 밥상 위의 것은, 본능적으로인지 알수 없지만, 쳐다도 보지 않는다.
"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고, 더럽지도 않아"라고 그녀들 중 한 사람은 그녀들에게 말하면서 젓가락질을 한다.
게다가 이 여자다운, 그리고 가정적인 모습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일까. 한 사람의 남자가 남긴 건, 그녀들 중 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먹는 것이었다. 이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녀들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이런 얘기는, 손님에게는 결코 흘리지 않는 그녀들의 비밀이지만, 밥상 위에서도 바람둥이는, 역시 오키누였다. 오키누가 상류의 집(창녀촌)으로 옮긴 후부터는 오유키였다.
그런데, 공사장 인부 감독의 밥상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이런 짓은 거의 하지 않았던 오타키였다. 즉, 그의 여자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그녀들 식의 고백이었다.
카와바타 야스나리, 온천여관, 1929년
음식점의 남은 밥은 즉각 쓰레기통으로 가야한다고, 그렇게 믿어지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위생학이란 것이 유포하기 시작한 후일테다. 누군가가 손을 댄 음식에 다시 손을 댄다는 것, 그것이 격렬한 불쾌과 혐오감을 유발시키게 된 것은. 일테면 "카메라 출동"은, 그런 행위가 고발되어야 할, 금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 뇌리 깊숙한 곳에 심어놓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담론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다.
하지만 남은 밥이 불러일으키는 일차적인 감정이 과연 불쾌일까? 그건 불쾌 이전에 아까움 아닐까? 남은 밥에 대한 아까움이란 감정은, 보관과 증여라는 형식을 통해서 출구를 찾게 된다. 일테면 증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움이라는 감정 속에 억눌려져 있던 포만감은, 제대로된 포만감으로서 체험될 수 있으리라. (때로는 두 번 배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밥을 남긴 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얘기. 그렇다면 남은 밥을 먹는 자들의 할 얘기는 뭘까?
카와바타가 보여줬듯이, 이건 더럽지 않아, 라는 자기 최면이 우선인 듯 하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증여받는 자는 증여되는 것이 더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먹다 남은 밥이나 돈 그 자체는 전혀 더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까?
거기에는 먹다 남은 밥은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엄연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만인에게 공평한 권리 속에서 비로서 주장=언어표현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작 주장=언어표현은 "이 남은 밥은 누구나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것이다"라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은 밥은 더러우니까 아무도 먹어서는 안되지만 이 밥만은 더럽지 않다"라는 식으로 전개된다. "나는 이 밥이 더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그게 얼마나 엉성한 논리인지, 혹은 그럴싸한 요설인지, 남은 밥을 먹는 그녀도 그걸 바라보는 그녀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주장의 최종 심급에 "사랑"이 개입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렇게 사랑이 개입하는 순간, 그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는 거다. "그가 남긴 밥도 실은 더럽지만, 나는 그것도 먹을 수가 있어.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어때?"
그녀들은 침묵하기로 한다. 그녀들의 침묵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녀들은, 바로 그 지점이 입을 다물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그 말로 남은 밥에 대한 권리주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밥상 위의 바람둥이의 존재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은 밥에는 임자가 없다.